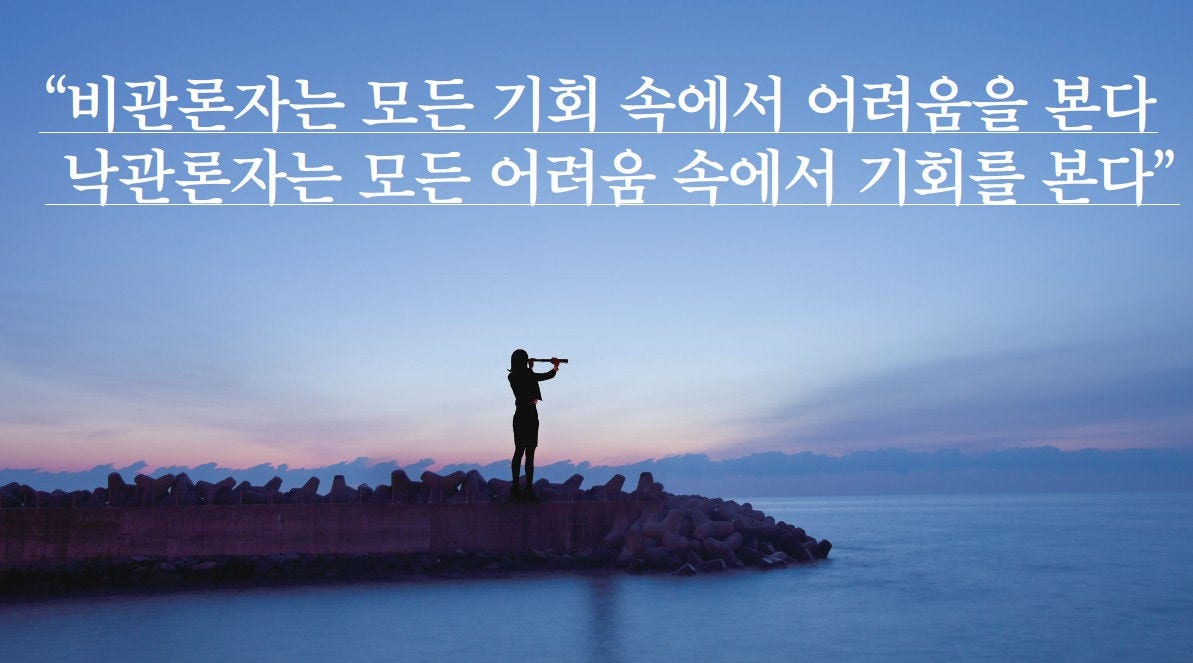
만약 당신이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수십 미터 깊이 지하 갱도에 갇혀버리는 일이 터진다면 어찌할 것인가? 실제로 페루 광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비관론자 그룹이다. “오 하나님, 우린 끝났어. 무슨 방법이 있겠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둘째, 낙관론자 그룹이다. “아니야, 우린 잘될 거야. 어떻게든 구멍이 있을 거야. 반드시 구조대가 올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셋째, 제3그룹은 비관도 낙관도 아닌 그룹이다.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
이들 중 가장 먼저 죽어간 사람들은 어느 그룹이었을까?
#긍정과 낙관의 혼동
“괜찮아, 앞으로 잘될 거야.” 사람들은 자주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한다. 현실이 힘들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막상 사전적으로 ‘긍정’이란 단어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라는 뜻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긍정의 진짜 뜻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다.
요컨대, 진정한 긍정은 낙관성이라기보다는 ‘수용성’에 가깝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와 같은 가짜 긍정론이 판을 치고 있다. 그저 다 잘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은 진짜 ‘긍정’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아야 한다.

#비관론자와 낙관론자
일반적으로 낙관은 긍정으로, 비관은 부정으로 해석되는데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숨어 있다. 실제 현실에서 낙관과 비관이 싸우면 대개 비관이 이긴다. 대표적인 곳이 주식시장이다. 늘 폭락을 주장하는 자는 선지자로 등극하고, 그 반대가 되면 불만이 없으니 조용하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는 말이 생긴 이유다. 이것은 아들딸 잘 맞힌다고 소문난 점쟁이의 비결이 매번 딸이라고 하는 데 있음과 같다.
우선 균형감을 잃은 긍정성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보고 듣게 되고 반대의 결과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아나 현상(Pollyanna Hypothesis)>은 지나친 긍정의 부작용을 이르는 용어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큰 실수다. 필자가 말하자고 하는 건 진짜 긍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자는 데에 방점이 있다. 실제 현실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은 이란성 쌍둥이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이라 해서 무조건 ‘하면 된다’는 군대식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때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여건에서 가장 긍정적인 힘이 발휘될 때도 있다. 이를 가리켜 ‘부정적 생각의 긍정의 힘(the positive power of negative thinking)’이라 한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비관적인 생각이나 염세적인 생각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혁신은 긍정보다는 부정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는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근거 없는 낙관의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심리학 이론으로 일종의 희망의 역설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 해군 폭격기 조종사, 제임스 스톡데일 대령은 무려 8년 동안 하노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기적 생환했다.
예상보다 많은 미군이 수용소에서 죽어 나간 이유를 묻는 인터뷰 질문에 그는 ‘낙관주의’라는 한마디로 대답을 대신했다. 생지옥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남긴 말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진다. “저에겐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을 기업경영에 도입한 사람은 짐 콜린스 박사다. 그는 세계적인 명저 『Good to Great』에서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한 회사는 살아남은 반면, 조만간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낙관한 회사들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삶이 계획대로 된 적은 거의 없으며, 낙관적 예측의 결과는 대부분 비관적이다. 여기서 고수들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낙관적 마음으로 일하라고 충고한다. “내 지식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의지와 희망은 낙관적이다.”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다.

